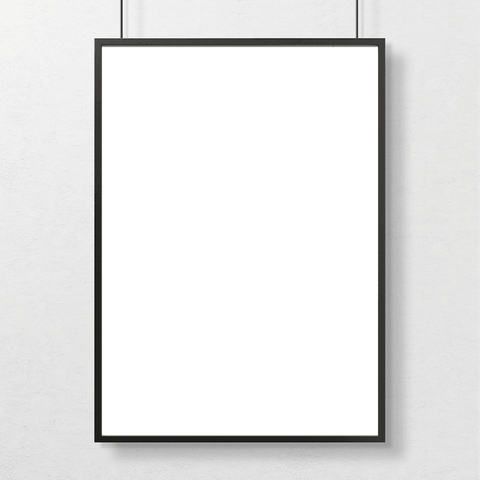전시 상세


GARDEN BLUE, 꽃이 아닌 꽃
(Not A Flower, Yet A Flower)
전시서문 Exhibition Foreword
꽃이 아닌 꽃. 이미 그 이름 안에 어떤 설명도 배제하는 '역설'이 놓여 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그리하여 꽃이 아니다' 라고 말한 순간에도, 그것은 여전히 꽃'으로 존재하는 실재를 향한 질문이다."도가도 비상도(*미##끝) 이름 붙일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꽃이 아닌 꽃. 이 말은 곧 꽃이라 불릴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시선이자, '꽃이라 불리는 것조차 결국은 꽃이 아닐 수 있다'는 근원적인 존재론적 질문이다. 김선형의 회화는 이 말에서 출발한다. 언어로 붙잡을 수 없고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의 본질을 추적해 나간다. '꽃이 아닌 꽃'은 이름 이전의 상태, 형상 이전의 감각이며, 정해진 의미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다.
존재는 말해지는 순간 원래의 상태에서 멀어진다. 언어의 틀에 갇히기 전, 작가는 말해질 수 없는 경계에서 '꽃'이라는 명명된 대상이 아닌, 꽃이 되기 이전의 감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정서를 화폭에 담는다. 그의 그림은 현상과 본질 사이의 틈새, 보이는 것과 말해질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응시한다. 김선형의 작업은 '무엇을 그렸는가'를 넘어, '존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말해지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감각되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품고 있다. 그렇기에 김선형이 그리는 꽃은 꽃이 아니다. 꽃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 상징, 관습적 의미들이 덧씌워지기 이전의, 언어화되지 않은 존재상태다. 작가는 꽃을 그리되, 꽃이라 불리기 이전의 어떤 것을 그린다. 실재의 묘사가 아닌, 실재와 허상의 경계선상에서 부유하는 감각이다. 작품 속 꽃은 '꽃'이라는 개념으로 고정되지 않고, 감각이나 감정의 흐름으로 잠시 드러난 형태일 뿐이다. 그의 회화는 놀이처럼 자유롭고 무위자연처럼 자연스럽다. 밑그림 없이 그려진 선들과 흘러내리는 물감의 우연성은 작가가 자연과 순간과 함께 호흡한 흔적이다.미리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의식에서 벗어난 순수한 존재의 움직임으로 '지금 여기'의 감각을 따른다. 그의 작업은 '꽃'이라는 이름에 고정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롭다. 작가는 정의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해, 언어 이전의 감정을 추적한다. 그리하여 꽃'은 보는 이의 감정과 기억,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 우리 앞에 놓인다.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에서 자신 안의 '이름 붙일 수 없는 것'과 마주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꽃이 아닌 꽃'을 다시 본다. '보여진 꽃은 정말로 꽃일까?' '당신은 이름 없는 것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이는 회화에 대한 질문을 넘어,
우리가 '본다'고 여기는 모든 감각에 대한,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모든 확신에 대한, 우리가 '이름 붙여'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한 본질적 되물음이다. 작가는 허구와 사실 사이에서 우리의 자기확신, 꽃이 꽃이라 불리는 것의 당위성, 그것이 정말 꽃인지에 대해 묻는다. 김선형의 꽃은 우리 안에 머물렀으나 붙잡지 못했던 푸르고 깊은 어느날의 감정으로 다가온다. 꽃이라는 이름이 붙기 이전의 색채이자, 우리 마음 깊숙이 머무는 푸른 감정,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서 단지 '푸르다'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시간 속 감정이다.
위 내용은 전시 소개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The above is an excerpt from the exhibit introduction.